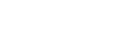- 전 홍 섭 (시인․ 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지난 2월 26일자 A29면 「‘경기도 광주’ 대신 그냥 ‘광주’로 불러주세요.」라는 제목의 신동헌 광주시장의 글을 읽었다.
원래 지명은 인명과 함께 대표적인 고유명사다.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그런데 인명에 동명이인이 있는 것처럼 지명에도 동명이처(同名異處)가 있다. 물론 한자로 표기하면 다르지만 한글로 적거나 발음할 때는 구분이 안 되어 혼란을 주는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앞에 광역지명을 붙여‘경기도 광주’, 또는‘전라도 광주’하는 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물론 행정단위는‘광주시’와 광주광역시‘로 다르다.
그럼에도 신동헌 광주시장은 행정단위는 빼고 본래 지명인 2음절의 ’광주‘로 불러주기를 바라는 것 같다.
이에 대해 국어학적 측면에서 두 가지의 방안을 제시해 본다.
먼저 말소리를 발음할 때 그 장․ 단음에 따라 의미를 구분하자는 것이다. 우리 국어에서는 자음과 모음에 따라 단어의 뜻이 달라지지만 말소리의 길이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어문각에서 편찬한「표준 한국어발음대사전」을 보면 〔광주 光州〕는 짧게,〔광ː주 廣州〕는 길게 발음하도록 되어 있다.
그 표시는 장음부호(ː)를 달거나 음절 위에 선을 그어 표기한다. 원래 언어의 근본은 글말(문자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말(음성언어)에 있다.
표준어를 제정함에 있어 낱말들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맞춤법 못지않게 어떻게 발음하느냐 하는 표준발음법도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국어는 자음과 모음에 의해 단어의 의미가 달라진다. 그러나‘비분절 음운’이라고 해서 소리의 길이, 높낮이, 세기에 의해서도 의미가 분화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국어에서는 이점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 다만 발음하는 길이에 따라 의미가 구분되는 어휘가 있다.
우리가“제주도에는〔말馬〕이 많다.”와“그 사람은〔말ː言〕이 많다.”를 구분하는 것은 자모(字母)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고, 발음할 때 모음을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중세국어에서는 음의 높낮이에 따른 성조(평성, 거성, 상성)가 있었다. 그 중에서 상성이 오늘날 장음으로 변하였다.
다음으로 순우리말 이름으로 대체해 보자는 것이다. 지금도 지역에 따라서는 순우리말로 된 속지명(俗地名)을 많이 쓰고 있다.
전국의 주요 도시 이름을 보면‘서울’을 제외하고는 순우리말 이름이 없다. 더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획일적으로 바뀌거나 일본식 한자로 만들어진 지명이 너무나 많다.
그럼에도〔광주(光州)〕는‘빛고을’이라는 우리말 이름을 많이 쓰고 있다. 이에 대해〔광ː주廣州〕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다.
광주(廣州)는 원래 너른 땅이었다. 삼국시대에는‘위례성’으로 376년 간 백제의 도읍지였다.
고려 이후 광주 목(牧)이었다가 조선 선조 때에는 23개 면을 다스리는 부(府)로 승격되기도 했다.
지금의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 그리고 서울의 송파, 강동구와 강남구의 일부가 모두 광주 땅이었다. 그러니 순우리말 지명인‘너른골’이라는 이름이 실감이 난다.
이것은‘광주’라는 한자어 지명 이전부터 이 지역의 주민들이 즐겨 썼던 고유한 지명일 것이다. 단순히 땅의 면적만 넓다는 뜻보다는‘매사 여유가 있고 인심이 넉넉하다’라는 심리적 의미를 더 많이 함축하고 있다.
행정 명보다는 지하철 역명이나 톨게이트 명칭, 또는 지역축제 등의 브랜드로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더라도 자꾸 쓰다 보면 익숙해지고 정겨운 우리말 지명으로 정착될 수 있다.
언어는‘존재의 집’이라고 말한 철학자가 있다. 모든 사물들은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그 존재가 드러난다는 뜻이다.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읍․면․동의 이름을 바꾼 사례가 있다.
나름대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광주시도 ‘중부면’이라는 밋밋한 이름보다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면’으로 바꾸지 않았던가. 지명 속에는 우리의 역사와 함께 선조들의 삶의 모습이 들어 있다.
그래서 지명은 희로애락으로 점철된 민중들의 생활 터전으로 후손들에게 물려 줄 유산이기도 하다. 동음이처의 지명이 혼란을 준다면 우리말 규범에 맞게 달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